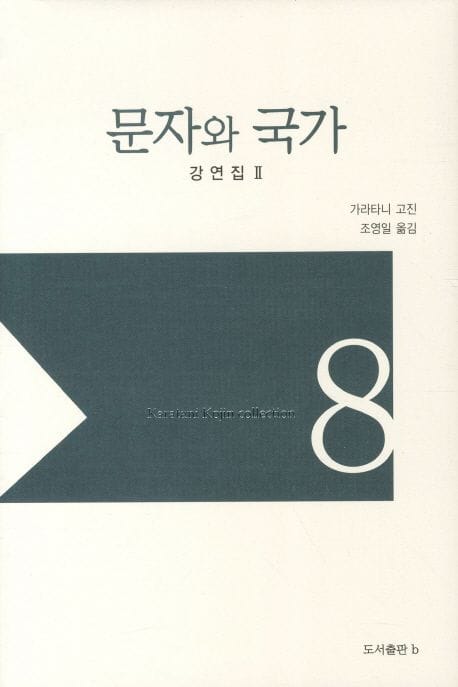서지정보
서명: 문자와 국가
저자: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역자: 조영일
출판사: 도서출판 b
출간일: 2011년 3월 30일
원서명: 〈戦前〉の思考
원서 출간일: 1994년
생각
『문자와 국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예술 1』에 이어 올리는 빌린책챌린지 책입니다. 서가에서 고르게 된 건 『은유로서의 건축』으로 알게 된 저자의 글을 좀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집게 되었습니다. 더 유명한 책이 아니라 강연집 Ⅱ(Ⅰ도 아니고!)를 집게 된 건, 뭐 이런 식으로 서가를 훑다가 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즐거운 오산이겠지요.
저자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한 강연을 모아 엮은 강연집인 이 책은, 당연히 여러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지마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살면서 꽤 오랫동안 의식할 일이 없었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을 설명한「의회제의 문제」에서는 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정돈할 계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키아밸리가 '어떤 권력도 대중의 지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 것(p.45)은 제 다음 읽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요.
「문자론」의 내용은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국어의 뿌리에 있는 근대적 필요성과 그로 설명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한 비판은 적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은 조악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만엽가나와 비슷한 것이 존재했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서술이나, 한국의 국한문혼용 폐지나 중국어의 조어방식에 대한 우려와 그로부터 30년이 넘은 오늘날의 두 언어를 보고 있으면 일본의 사례를 말하고 싶어서 든 곁가지 이야기가 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원리에 도달하는 결말 부분도 그다지 와닿지는 앟았습니다.
「자주적 헌법에 대하여」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언급되듯, 두 대립항의 관계를 단순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잘 읽히는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발적인' 메이지 헌법과 '외발적인' 전후헌법의 대조를 비판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에 들어가는 〈전전(戰前)〉을 생각하고, 일본의 원리가 아무것도 담지 않은 제로기호같은 것이라는 「문자론」의 결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결국 일본은 패전으로 인해 새겨진 강제를 (첫 번째)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근대에 대해 말하는 책이라는 걸 생각하여 한국에 외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국권을 침탈당한 사건으로 새겨진 좌절을 원리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과 조선-대한제국을 연결짓는 것 또한 '근대'적인 발명일까요?
제가 모르는 건 여전히 많고, 여기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째 책을 읽어나갈수록 읽어야 할 책의 목록이 오히려 늘어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