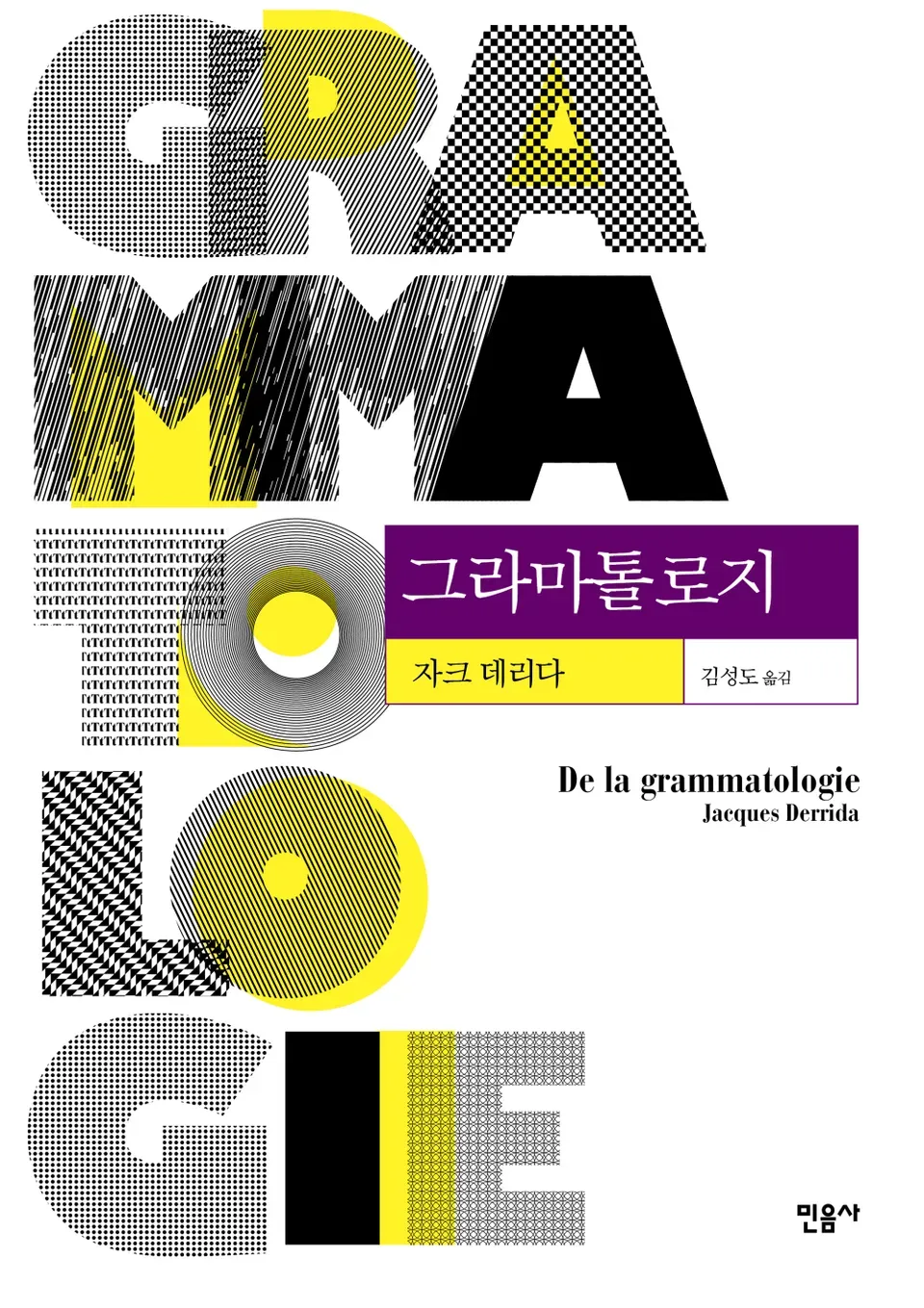서지정보
서명: 그라마톨로지
저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역자: 김성도
출판사: 민음사
출간일: 2010년 10월 17일
원서명: De la grammatologie(프랑스어)
원서 출간일: 1967년
생각
『어려운 책을 읽는 기술』로 시작해서, 『HOW TO READ 데리다』를 거쳐 『법의 힘』까지 읽은 여정이 바로 이 책 『그라마톨로지』에 닿았습니다. 이 책은 집 근처 도서관에 없어서 상호대차를 신청했는데, 말인즉슨 대여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제가 이 책의 실물을 볼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서님이 건네주는 책의 두께를 본 순간,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여하는 시점에서 대여연장을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냥 빌림과 동시에 대여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간을 내지는 못했지만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회사 점심시간에 빈백에 누워 조금씩 읽어나갔음에도, 1부와 2부 중에서 1부만 읽고, 번역자의 해제만 좀 훑었는데 대여기간 3주가 흘러버렸네요.
확실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떤 맥락이 있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경위 같은 것도 잘 알지 못한 채 읽게 되었지요. 다행히 번역자분께서 해설을 많이 달아주신 덕분에 배경에 대한 이해는 꽤 진행되었지만, 그 기반에서 저자가 택한 논증 방법이나 주장을 잘 이해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읽은 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 책의 2장에서 전개되는 소쉬르에 대한 비판은, 제가 이해했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쉬르가 자신의 개념으로 기존의 형이상학, 그러니까 어떤 근원이 있고 그것을 모방하는 무언가에 대한 세계관('세계'와 '언어'의 관계)에 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이상학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리다는 그런 접근의 한계를 인지하고, 문자를 부가적인 무언가로 보았을 때 놓치는 것들을 주워담아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주워담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흘러내려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기술』을 읽은 결과로서의 이 책을 이야기해보자면, 해당 책은 저자의 텍스트를 다른 해설과 분리해서 깊게 읽는 상황을 전제로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에게는 필요한 능력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읽은 두 책, 『법의 힘』도 이 책도, 그 자체로 옮긴 이의 해설이 하나로 묶인 책입니다. 해설을 분리해서 읽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미주와 각주가 빡빡하며, 번역어의 선정에 까다롭고, 번역자가 제시하는 읽음의 자세를 번역문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기술』의 저자는 번역서의 품질을 따지는 건 일단 뒤로 하고 양서가 많이 번역되는 (일본의) 행복한 상황을 향유하자며, 굳이 원문을 읽을 필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데리다와 같이 번역자에게 괴롭고, 따라서 번역된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괴로운(그리고 즐거운) 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음을 던지고 싶긴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인 『은유로서의 건축』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원래 기존의 철학을 얼마나 잘 비판하느냐에 따라 이름의 가치가 오르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라타니 고진이 명성을 얻은 것도 서양 철학의 건축에 대한 의지, 그러므로 토대가 없는 곳에 토대를 세우고 설계하는 것으로서의 서양 철학의 (궁극적으로 헛된) 노력을 지적했(고 그것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논쟁적인 인물이었다고 하지요. 거기에는 제가 잘 모르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이 책의 번역자분도 '소쉬르의 저작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판을 남겼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자크 데리다라는 인물은 서양 지성의 전통을 (요즘 말로) '긁'는데 근래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